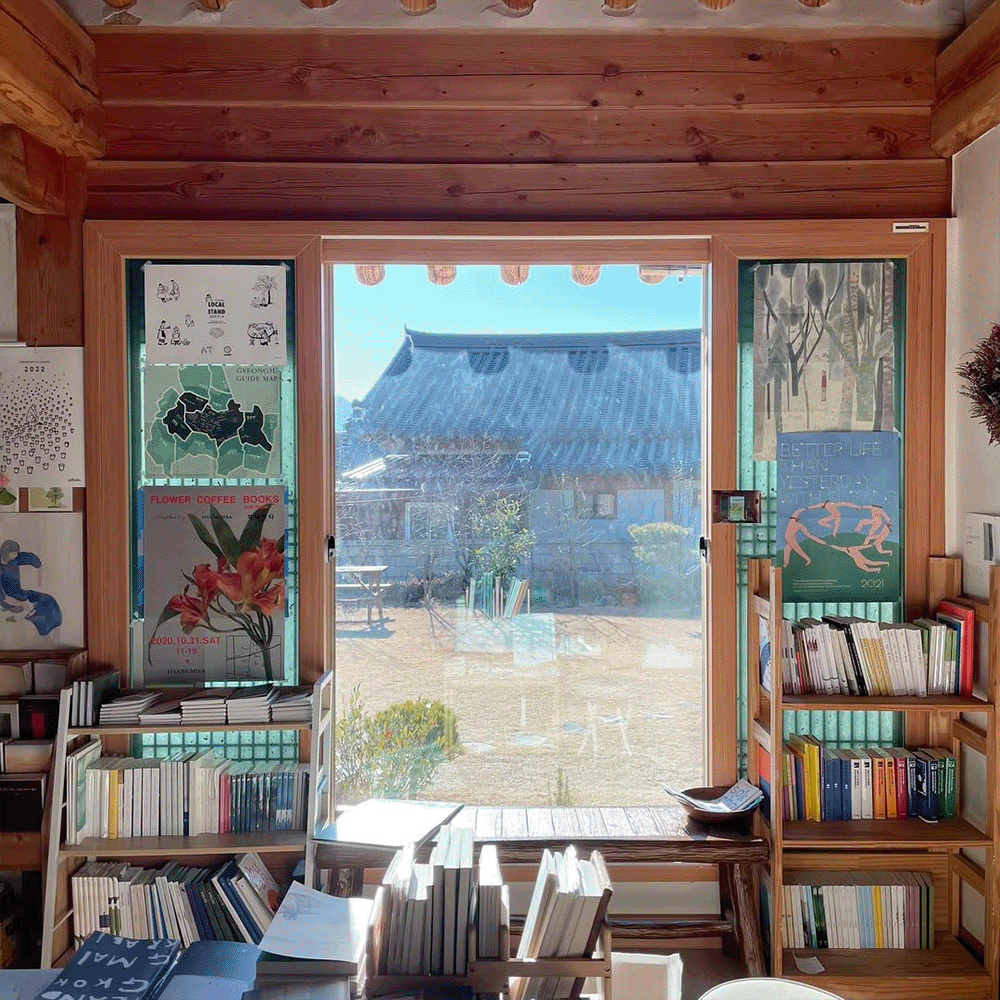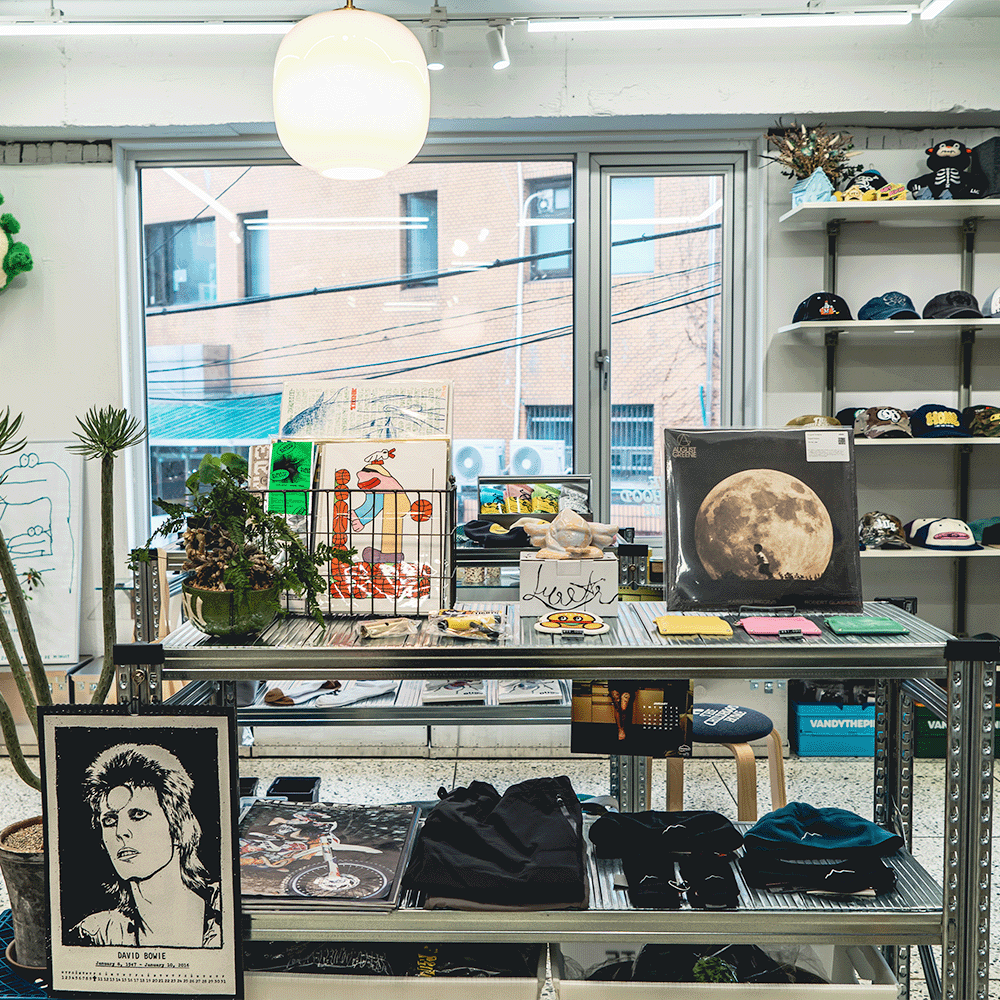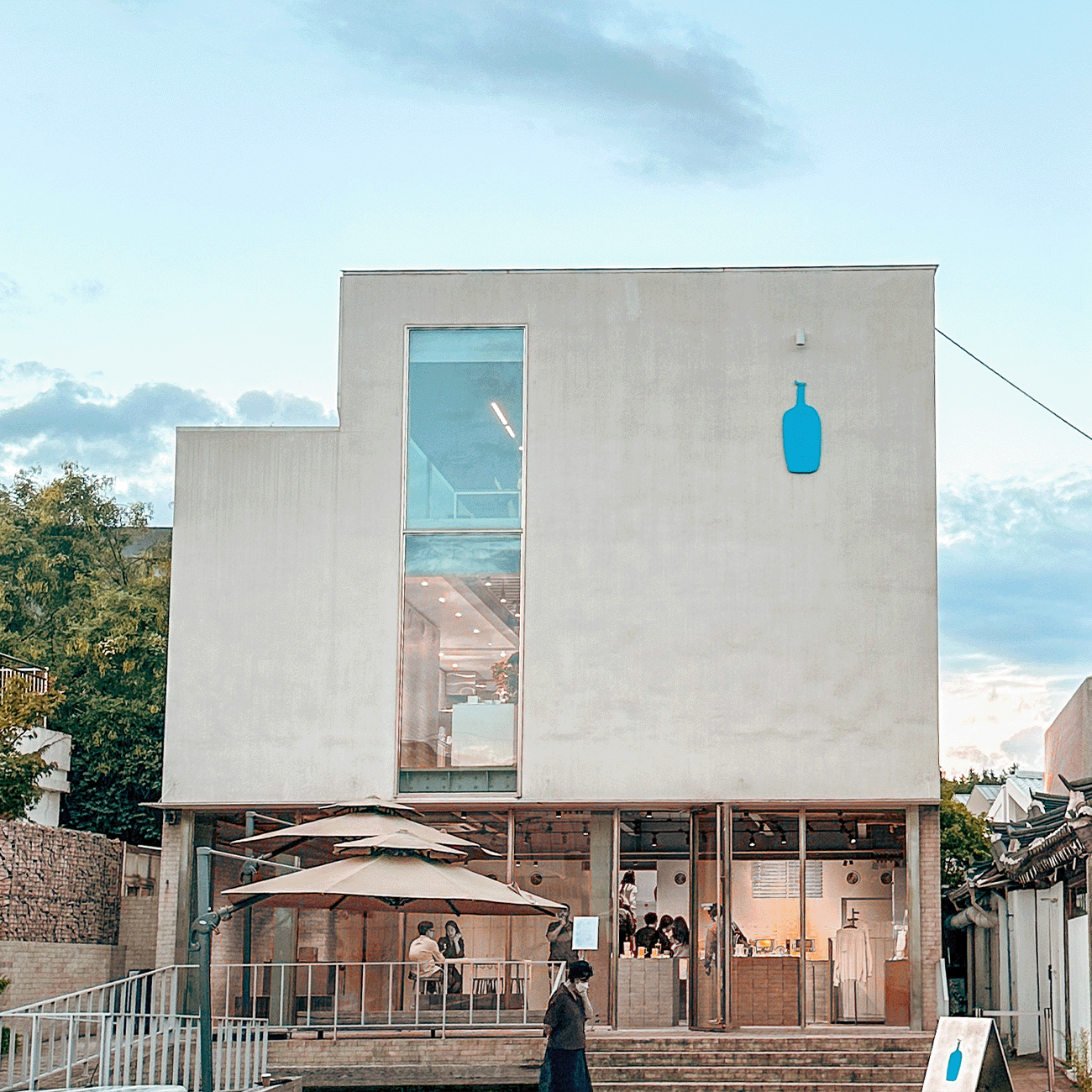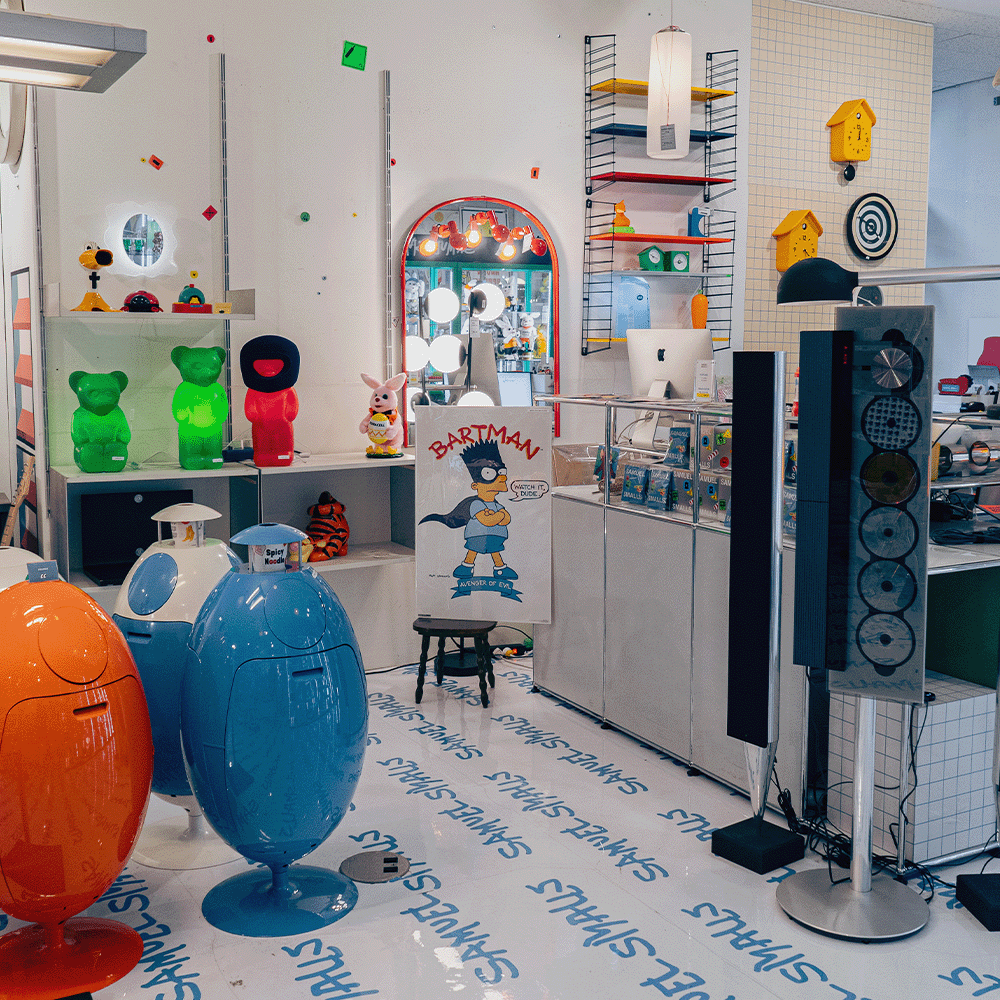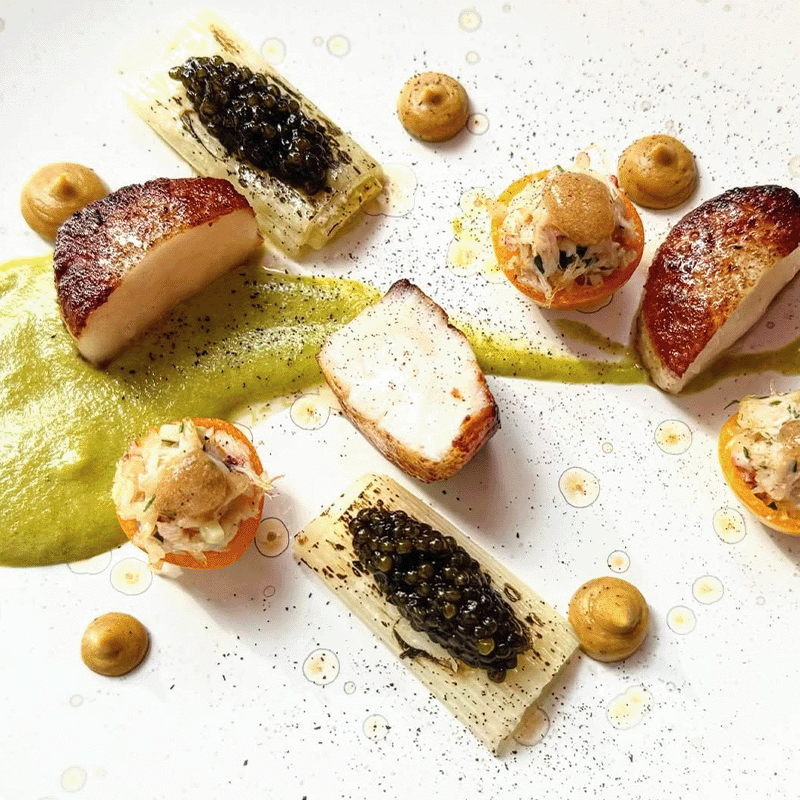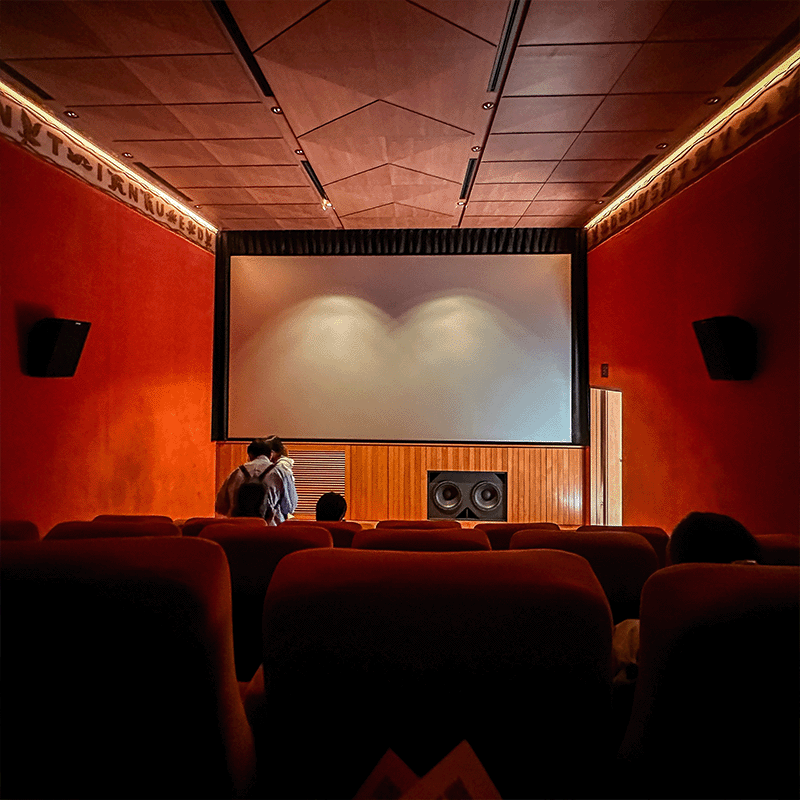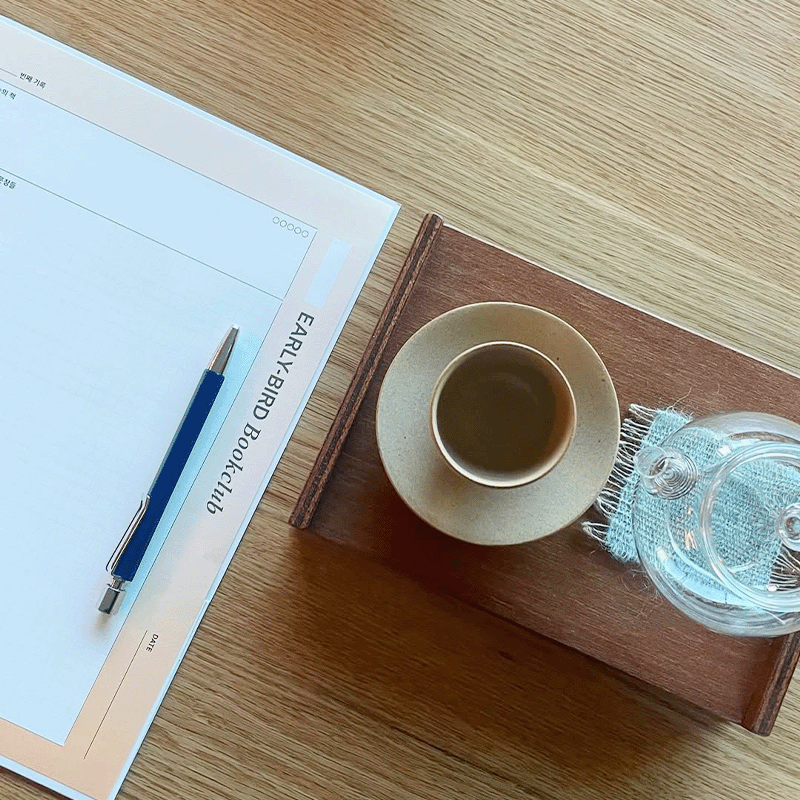다랭이 논이 들어오는 순간
창을 여는 순간, 층층이 포개진 다랭이논이 한 장의 파노라마처럼 방 안을 채웁니다. 자작나무 결이 살아 있는 실내는 문턱에서부터 은은한 나무 향을 내고, 콤팩트한 복층 구조와 높은 층고 덕분에 ‘작지만 넉넉한’ 공간감을 줍니다. 이 집의 매력은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를 소거하는 데서 시작돼요.
주변이 소란스럽지 않은 작은 산골 마을이라는 맥락, 통창 앞으로 길게 놓인 데크, 좌우로 펼쳐지는 논두렁의 선과 계절의 색—모든 것이 느린 호흡을 요청하죠. 밤이면 별자리의 윤곽이 또렷해지고, 초여름이면 반딧불이 스치듯 지나가며 장면을 바꿉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진보다 현장이 더 예쁘다”, “그냥 쉬러 남해에 또 오고 싶다”는 후기들이 자연스레 쌓이고 있습니다. 숙소 소개 문구 그대로, 이곳은 다랭이논이 주는 안온함 속에 잠시 머물다 가기에 딱 좋은 집입니다.


재방문을 부르는 이 집의 디테일
설레인별의 아침은 조식에서 힘을 얻습니다. 라따뚜이나 그릭요거트 같은 소박한 메뉴가 통창의 햇살과 겹치면서 하루의 톤을 산뜻하게 올려 주죠. “웬만한 식당보다 맛있었다”, “아침을 선물받은 느낌” 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간은 크지 않지만 동선이 알뜰해서 아이·반려동물 동반도 편하고, 침구·욕실·주방 등의 기본기가 유난히 탄탄하다는 평이 이어집니다.
호스트의 응대가 빠르고 친절하다는 점도 신뢰를 더해요. 연박을 우선으로 받되 일정에 따라 1박이 열리는 운영 방식, 조용한 마을과 통창의 뷰가 만든 집중력 높은 휴식, 청결과 감성 사이의 균형—이 삼박자가 재방문 의사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다음에도 이 숙소부터 일정 확인하겠다”는 게스트의 말은 이 집에 가장 어울리는 리뷰일지 모릅니다.


시골 리듬에 맞춰 하루를 편집하다
이곳을 가장 잘 즐기는 법은 ‘시골 리듬’에 몸을 맞추는 것입니다. 도착 전 에어비앤비 캘린더와 공식 인스타그램 공지를 함께 확인하고, 간단한 간식과 마음 가는 책을 챙기면 절반은 성공이에요. 아침엔 창가에서 햇살과 조식을 충분히 즐기고, 낮에는 집 아래 다랭이논 산책으로 호흡을 고르세요. 오후엔 데크에서 마을 바람을 들이며 휴식의 무게를 더하고, 해 질 녘엔 사촌해수욕장처럼 가까운 바다를 가볍게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돌아와서는 데크에서 담소를 나누며 별을 올려다보면 하루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됩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많지 않다는 점은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도시의 속도를 잠시 잊고, 조용한 밤공기로 감각을 재정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니까요. 예약은 에어비앤비가 기본, 메시지로 연박 우선·1박 오픈일 안내를 받아 두면 수월합니다. 바비큐는 데크에서 가능하며, 현장 비용이 별도로 공지됩니다.